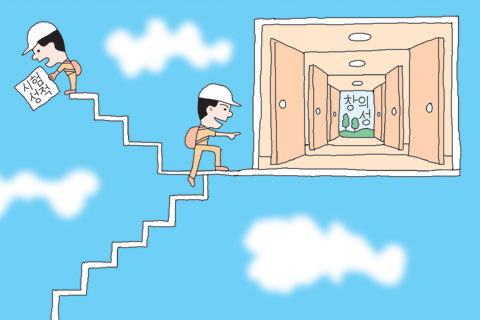국가차원에서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육을 하나의 전쟁같은 투쟁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 특목고니, 사교육이니 하는 곳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정작 세계대학 랭킹 50위권에 단 1개 대학만 있는 곳.
결국 우리 나라 학생들은 공부는 타국가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지만,
아주 잘해야 세계 50위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설령 사회에 진입하더라구 회사내에서 튀거나 독특한 것(Unique)을 이상한 것(strange)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일상이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차세대 리더나 새로운 혁신과 리노베이션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조선일보 위클리 특집기사에 이에 대한 좋은 기사에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의 대부분 기사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무엇이 경제 질적성장을 가로막나 누가 창조적 사고를
죽이고 있나' 장용성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미 로체스터대 교수)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나라 학생들은 공부는 타국가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지만,
아주 잘해야 세계 50위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설령 사회에 진입하더라구 회사내에서 튀거나 독특한 것(Unique)을 이상한 것(strange)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일상이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차세대 리더나 새로운 혁신과 리노베이션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조선일보 위클리 특집기사에 이에 대한 좋은 기사에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의 대부분 기사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무엇이 경제 질적성장을 가로막나 누가 창조적 사고를
죽이고 있나' 장용성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미 로체스터대 교수)에서 인용하였습니다.
학습능력에서는 한국은 최상위권
경제학 분야 석학 강연 시리즈 중 하나인 '길버트 강연회(Gilbert Lecture)'에서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 에릭 하누섹(Eric Hanushek) 박사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교육 경제학의 대가이다.
강연에서 그는 중·고등학생의 학습 능력 평가에서 대만이 1위, 한국이 2위, 미국은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고교 교육의 학업 성취도 개선만으로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보다 1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학업 성취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교재나 첨단 시설 등 다른 어떤 요소도 학습 능력 개선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국 학생들의 경우 시험 성적은 좋아도 창의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가 이런 답을 했다. 시험 성적이 높다고 창의적이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창의성이 부족하란 법 또한 없다. 축구 선수가 반드시 야구도 잘하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다른 운동을 잘할 확률이 높듯이,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이 창의적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학습이외 능력에서는 한국은 최하위권
한국 사람의 창의력 부족은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센티브의 문제라는 견해가 많다.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윗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시험은 잘 보지만 창의적인 논문을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많은 외국 교수들은 한국 유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당당히 "노(No)" 라고 말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한다.
하누섹 교수는 한국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도교수인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한 학생에게 이런 태도를 갖게 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들도 창조적 연구를 적극 장려하지 않는 것 같다. 대학과 정부의 연구 업적 평가는 SCI(과학 논문 인용 색인), SSCI(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 등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숫자에 크게 의존한다. 자의적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 업적을 수량화한 제도지만, 논문의 질(質)을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SCI나 SSCI에 포함된 학술지라 해도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최상급 학술지의 경우 투고 논문의 채택률이 10%에 불과하고 심사 과정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반면 상대적으로 출판이 수월한 학술지도 있다.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제주체라면 누가 굳이 쉬운 길을 두고 힘든 길을 가겠는가? 젊은 연구자들이 승진 심사 기한이 다가오면 논문 편수를 채우기 위해 지금껏 해오던 훌륭한 연구를 서둘러 마무리해 게재하기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채 익지 않은 과일을 따버리는 격이다.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스탠퍼드대학의 폴 로머(Paul Romer)가 로체스터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에 생긴 일이다. 그는 임용 후 3년이 지나도록 논문을 한 편밖에 쓰지 못했다. 그나마 박사 학위 논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었다. 교수 회의에서 재임용은 시켜주되 분발하라는 의미로 구두 경고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일반균형이론으로 유명한 원로 교수 라이오넬 맥킨지(Lionel McKenzie)가 "나는 폴이 평범한 논문을 양산하는 학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 지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만류했다. 과연 그는 임용된 지 5년이 지난 뒤 지식의 상품화와 기업의 R&D 투자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임을 규명하는 내생적(內生的) 경제성장 모형을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해 전 세계 학계를 흥분시켰다. 로머는 이 논문 한 편으로 모교인 시카고대학 정교수로 영전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Beautiful Mind)'의 주인공이자 비협조적 게임이론의 '내시 균형'을 창안해 노벨상을 수상한 존 내시(John Nash) 역시 한평생 쓴 경제학 논문이 단 3편밖에 없다. 노벨상 선정 위원회는 모여서 논문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구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는가?"를 논의한다.
오래전 한국에서 첫 직장 선배로부터 이런 충고를 들은 일이 있다.
"처음 3년 동안은 나서지 말고, 아무 말 말고, 조용히 있어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책정된 예산이 없거나 관행에 어긋난다는 답변이 되돌아온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 예산이 없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데도 말이다. "너무 튄다"는 지적을 받고 나면 의욕도 사라진다. 굳이 나서다가 눈 밖에 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눈치를 보게 된다.
한국인의 창조성이 부족한 하나 이유를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단일민족'이라는 특성도 기인한다고 한다.
창의성이 풍부한 나라들은 보면 한결같이 종교, 인종, 이념에 대해서 개방적인데.
울 나라는 아직도 6.25 전후세대간의 이념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성공하지 못한 나라일 정도로 단일 민족 정서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영어에서 Understand라는 뜻을 해석하면 남의 밑에서 바라보다 = 상대방의 밑에서 바라보면서 이해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창의성의 시작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창의성이 풍부한 나라들은 보면 한결같이 종교, 인종, 이념에 대해서 개방적인데.
울 나라는 아직도 6.25 전후세대간의 이념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성공하지 못한 나라일 정도로 단일 민족 정서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영어에서 Understand라는 뜻을 해석하면 남의 밑에서 바라보다 = 상대방의 밑에서 바라보면서 이해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창의성의 시작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Media & 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V 2.0 시대에 콘텐츠 TV와 IPTV간 대결구도는... (0) | 2009.08.11 |
|---|---|
| 컨버전스 사례 (0) | 2009.08.04 |
| 크로스 미디어 시대 콘텐츠 운영전략... (0) | 2009.07.14 |
| 기술 차별성으로만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0) | 2009.07.09 |
| 스폰지 밥의 유비쿼터스형 미디어 콘텐츠 전략이란? -KMCM 행사를 다녀와서 (0) | 2009.06.30 |